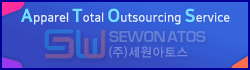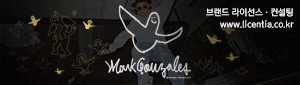세계 4대 컬렉션,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
발행 2016년 04월 26일
박선희기자 , sunh@apparelnews.co.kr
 런던, 밀라노, 뉴욕, 파리로 이어지는 세계 4대 컬렉션은 글로벌 패션 트렌드의 발신지를 자처해 왔다. 밀라노, 파리와 같이 패션 산업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런던, 뉴욕컬렉션과 같이 글로벌 문화를 리드한다는 자부심의 무대이기도 하다.
런던, 밀라노, 뉴욕, 파리로 이어지는 세계 4대 컬렉션은 글로벌 패션 트렌드의 발신지를 자처해 왔다. 밀라노, 파리와 같이 패션 산업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런던, 뉴욕컬렉션과 같이 글로벌 문화를 리드한다는 자부심의 무대이기도 하다.
국내는 물론 세계의 패션 기업들은 이들이 6개월 전에 제안하는 트렌드를 바탕으로 상품을 기획한다.
4대 컬렉션에서 선보여진 컬러, 소재, 실루엣은 기성복 회사들의 길잡이가 되고, 패션 시장의 유행이 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을 소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견고한 믿음이 이 세계를 유지해 온 매카니즘이다.
이들의 제안이 ‘유행’을 만든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스키니 팬츠가 어느 날 갑자기 촌스럽게 느껴지고, 오버사이즈 코트가 아니면 유행에 뒤떨어진 듯 보이는 관점의 변화는 이들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션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가깝게는 70~80년대, 멀게는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했던 패션이나 문화적 사조가 재해석되거나, 각각의 경향들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한다.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스티브 잡스 조차도 “아이폰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졌다”말했다.
언제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관점의, 혹은 발상의 ‘전환’이지 ‘발명’이 아니다. 최근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4대 컬렉션에도 균열이 일기시작했다. 적어도 패션의 정보에 있어서만큼은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믿었던 이들 4대 컬렉션에 대해, 과연 향후 지속적으로 이 패션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4대 컬렉션의 ‘제안’을 바탕으로 상품을 기획하는 기성복 회사들은 그들의 ‘예측’이 과거만큼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패션 산업의 불황은 4대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순환 매커니즘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더 근원적으로는 패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의 변화라는 측면이 작용한다. 이 시대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커버그는 똑같은 상의와 청바지, 운동화를 사시사철 입는다. 한 때 이들의 패션스타일이 ‘놈코어’의 대표 사례라는 억지스러운 해석도 있었지만, 사실 이들은 ‘넌-패션(non-fashion)’에 더 가깝다. 한마디로, ‘패션이 중요하지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시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면서 그 스타일조차 선망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급기야 스웨덴의 SPA ‘H&M’은 마크 주커버그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게 패션이라고?” 4대 컬렉션을 만드는 자존심 강한 패션계가 보면 기가 찰 노릇이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실용과 효율의 시대에 패션의 생명줄 같은 ‘부가가치’ 혹은 ‘명성’은 거추장스러운 어떤 것으로 전락하는 신세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급기야 4대 컬렉션 중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뉴욕컬렉션은 100년이 넘도록 지속해 온 ‘제안’의 방식을 버리는 결단을 내렸다. 패션 전문가, 관계자들만 모여 벌이던 패션위크를 일반 대중에게 개방한다는 것, 그리고 6개월 후의 컬렉션을 선보이는 대신, 지금 당장 팔 컬렉션을 선보이거나, 6개월 후에 컬렉션을 하겠다고 나선 디자이너들이 늘기 시작한 것이다.
‘타미 힐피거’는 오는 9월 컬렉션부터 캣워크 쇼와 동시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고, 레베카 밍코프도 온라인 쇼핑몰을 런칭해 런웨이 제품 중 상당수를 동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토리버치, 아이안 본 퍼스텐버그, 라콴 스미스도 마찬가지다.
런던패션위크의 버비리와 톰 포드는 9월부터 런웨이 쇼 동시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단의 배경은 이렇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채널이 일반화되면서 그들만의 ‘독점’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컬렉션 당시 이미 그들이 제안한 유행을 공유하고,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패스트 패션’을 만들어내는데, 정작 본인들은 6개월 후에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불균형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독점’이 곧 매력인 시대가 끝났다는 자각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올해 4대 컬렉션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밀레니얼스’ 디자이너들의 면면을 보면 세계 패션계 자체가 이제 세대교체의 중간에 있음을 드러내는 듯하다.
발렌시아가의 디렉터로 컬렉션을 진행한 뎀나 즈바살리아는 2년 전 ‘베트멍’이라는 ‘어글리(ugly)한 스트리트 패션’으로 전 세계를 열광케한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가수 ‘지드래곤’의 워너비 패션으로 유명해졌다.
꾸레쥬의 20대 아트 디렉터 세바스티앙 메이어와 아르노 바이앙은 또 어떤가. 뎀나는 너무 과한, 세바스티앙은 너무 간결한 패션이지만, 이들은 모두 기존 패션계의 상식을 부정하는 ‘역설’을 시현함으로써 열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파격적인 스타를 찾던 하이엔드 패션계의 의도된 갈채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세대교체의 대표주자라는 주장에 이의를 다는 이는 없다. 이들이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SNS를 통해 스타일이 전파되고 매니아들의 열광이 쏟아진 덕분이다. 그 덕분에 하이엔드 패션 하우스에 당당히 입성한 것이다.
4대 컬렉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국내 패션계가 처한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제도권은 고립되고, 이들 밖의 패션 세상이 점점 부풀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는 ‘밀레니얼스’들. 이 상황을 돌파할 방법 중 하나는 하이엔드 디자이너가 SPA와 손을 잡고, 스트리트 패션의 디자이너를 명품 하우스가 영입하듯,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공유와 협력’의 시대가 왔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1 스포츠, 커스텀 서비스 강화
- 2 남성복 전문 기업, 빈익빈부익부 심화
- 3 글로벌 명품 1분기 실적 양극화 심화
- 4 하고하우스 다음 스텝은 오프라인·해외 확장
- 5 ‘마뗑킴’이 만든 항공 승무원 유니폼
- 6 남성 슈트 소비 줄었지만 고급화 경쟁, 왜?
- 7 '라코스테' 한국 매출, 佛·美 이어 세계 3위
- 8 신원, 수입 브랜드 육성 속도
- 9 핵심 상권 주간 리포트
- 10 국내 유일, 명품 브랜드 코트 원단 공급하는 예성텍스타일
- 11 SG세계물산, 패션사업 1분기 매출 250억
- 12 프랑스 여성복 ‘썬쿠’ 첫 매장
- 13 유아동 플랫폼 ‘무무즈’ 해외로 간다
- 14 ‘트루릴리젼’ MZ를 위한 스트리트 패션으로 재탄생
- 15 ‘컴젠’, 고객 접점 넓힌다
- 16 50년 역사의 ‘브롬톤 런던’, 성수에서 한국 MZ 만난다
- 17 네파, 신규 쿠셔닝 하이킹화 ‘휘슬라이저’ 출시
- 18 위글위글 X 아레나, 수영복 출시
- 19 ‘암피스트’, 상품 이원화
- 20 ‘비긴202’, 팬츠 매출 더 키운다
구인구직